[안인석의 ‘골프, 여행이 되다’] 나가사키 파크CC는 잔잔했고 오무라완은 잔인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조회 17 댓글 0본문
파크, 풍경과 어울리는 편안한 코스…계곡 넘고 호수 건너는 재미는 덤
오무라완, 경험한 적 없는 유리알 그린, 재밌지만 곤혹스럽고 결국 멘붕
일본 나가사키 글·사진=안인석 기자(부산경남지사 취재본부장) busanguy@traveltime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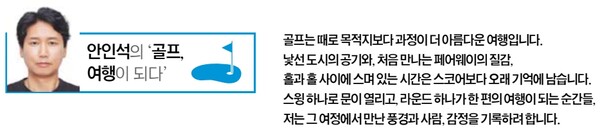

부산에서 나가사키로 향하는 전세기를 탔다. 비행시간은 짧았고, 여행의 목적은 분명했다. 2박3일, 골프를 치고 돌아오는 일정. 익숙한 패턴의 여행이었다. 그런데 나가사키에 도착하자 하늘이 열릴 기미가 없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축축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는 눈발까지 흩날렸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떨어질 것 같은 기색을 계속 품고 있었다. 흐렸다가 해가 나기를 반복하는 그런 날씨였다.
나가사키는 가벼운 도시가 아니다. 세계 2차대전 종전을 불러온 사건,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의 두 도시 중 하나. 이 도시는 늘 설명이 먼저 붙는다. 그래서 여행지로 마주해도, 마음 한편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흐린 날씨는 그 도시의 성격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빛이 없으니 풍경은 과장되지 않았고, 색이 줄어드니 감정도 낮게 깔렸다. 여행지 특유의 들뜸은 애초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여행객들은 나가사키 짬뽕을 먹고, 하우스텐보스를 찾고, 도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조용히 마음을 건드렸다. 이 도시는 늘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멈춰 세운다. 그런 도시에서 골프를 시작했다.

첫날 라운딩은 나가사키 파크컨트리클럽. 산중턱에 만들어진 골프장이었다. 아코디아그룹 소속 골프장이라 관리 상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페어웨이에 서자마자 골프장보다 공원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코스는 자연의 흐름을 크게 거스르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하늘은 계속 흐렸고, 간간이 비가 아주 조금씩 흩뿌렸다가 틈틈이 구름 사이로 해가 잠깐 얼굴을 내밀었다. 우산을 펼 정도는 아니었지만, 공기에는 늘 물기가 남아 있었다. 이날의 골프는 유난히 조용했다. 샷 소리도, 동반자들의 말소리도 모두 한 톤 낮아진 느낌. 괜히 큰 소리를 내면 이 숲의 리듬을 깨뜨릴 것 같았다.

페어웨이는 넓었고, 지형은 부드러웠다. 무리하게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코스였다. 계곡을 넘겨야 하는 티샷 앞에서도 괜히 심호흡부터 하게 됐다. 잘 치겠다는 생각보다 흐름을 깨지 말자는 마음이 먼저였다. 마지막 코스 18번 홀. 이 골프장의 시그니처인 연못 위에 걸린 ‘메가네 다리’가 눈에 들어왔다. 마무리 홀임에도 긴장보다는 풍경이 먼저 들어왔다. 흐린 하늘 아래 연못은 잔잔했고, 공은 그 풍경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첫날의 기억은 그렇게 큰 굴곡 없이 접혔다. 어쩌면 이 여행은 끝까지 이런 톤으로 흘러가겠구나 싶었다. 골프도, 도시도, 날씨도 모두 담담한 여행. 그 생각은 둘째 날 완전히 깨졌다.

오무라완 컨트리클럽. 올드코스와 뉴코스를 갖춘 36홀 골프장 중 올드코스에서 라운드를 했다. 이곳 역시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홀과 홀 사이를 가르는 삼나무와 편백, 소나무들. 수령이 느껴지는 나무들이 이 골프장의 시간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다.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 오래 지켜온 풍경을 그대로 두었다는 인상이 강했다.
새벽에 세차게 내리던 비는 멈췄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간간이 해가 나왔다 사라지는 어수선한 날씨였다. 겨울 특유의 쌀쌀함이 남아 있었고, 라운드 초반까지는 몸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린에 올라선 순간, 모든 감각의 중심이 바뀌었다. 공이 멈추지 않았다. 툭 치면, 예상보다 훨씬 더 흘러갔다. 눈으로 보기엔 평범한 그린이었다. 큰 언듈레이션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공은 계속 내 계산을 벗어났다.

경험해본 적 없는 그린 빠르기에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이게 뭐야’ 싶은 신기함. 국내 골프장에서 느끼기 힘든 종류의 당황스러움이었다. 하지만 몇 홀 지나지 않아 웃음은 사라졌다. 거리 감각이 무너졌다. 국내의 상대적으로 느린 그린에 내 몸이 얼마나 길들여져 있었는지, 그날에서야 알게 됐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 몸의 기억이 따라오지 못하는 문제였다. 그린 위에 서면 생각이 많아졌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질수록 결과는 나빠졌다. 겉보기엔 조용한 그린이 사실은 가장 공격적인 존재였다. 라운드가 끝나고 안 사실이지만 이날 그린 스피드는 3m였다.
라운드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늘은 조금씩 열렸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고, 기온도 함께 올라갔다. 겨울치고는 딱 좋다고 느껴질 만큼의 온도. 보통이라면 이쯤에서 기분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몸이 풀리고, 풍경이 살아나고, 골프도 함께 풀리는 순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나는 크게 들뜨지 않았다. 날씨는 좋아졌는데, 그린은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빛이 생기니 오히려 그린의 질감과 미세한 경사가 더 또렷해졌다. 보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더 많아졌다. 하늘은 열렸지만 이 여행의 정서는 끝까지 낮은 톤을 유지했다.

그나마 머릿속이 한순간 정리된 곳은 인코스 16번 홀이었다. 나무 사이를 지나 그린에 올라서는 순간, 갑자기 시야가 열렸다. 흐린 하늘 아래, 오무라만의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졌다. 빛이 없어서 더 좋았다. 화려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래 보게 됐다. 그 순간만큼은 그린도, 스코어도 모두 멀어졌다. 이 골프장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이번 나가사키 골프를 떠올리면 사실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많지 않다. 날씨도, 풍경도, 플레이도 모두 낮은 톤으로 겹쳐져 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멈추지 않던 그린 위에서 나 역시 중심을 잃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감각이 이 도시와 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것. 겉보기엔 조용하지만 막상 서면 쉽지 않은 곳. 나가사키는 그런 도시였고, 오무라완의 그린은 그런 장소였다.
골프 여행은 늘 그렇다. 모든 기억이 고르게 남지는 않는다. 대신 하나의 감각이 다른 모든 장면을 밀어내고 남는다. 이번 여행에서 나에게 남은 것은 흐린 하늘, 눌린 공기, 그리고 끝내 멈추지 않던 공의 속도였다.
나가사키에서의 골프는 그렇게 조용한 압력으로, 오래 남았다.
출처 : 여행신문(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List.html)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